<재료의 산책>이라는 동명의 요리 에세이를 내기도 했어요.
2013년부터2016년까지 한 월간지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단행본이에요. 당시 요리 코너 제목이 ‘재료의 산책‘이었어요. 매달 계절에 어울리는 재료를 선정하고, 그 재료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죠. 레시피를 소개한다기보다, 독자들이 페이지를 펼쳤을 때‘어,요즘 사과 철인가 보네?’하고 계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. 그렇게라도 틈틈이 재철 재료의 존재를 떠올렸으면 했거든요. 산책하듯이 가볍게요.
일본에서 유화를 전공했는데, 어쩌다 요리로 방향을 틀었나요?
워낙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,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음식이라는 매체와 잘 맞았어요. 학교 졸업하고 한때 사진을 공부하기도 했는데, 사실 저에게는 요리나 그림이나 사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결국 다 자기표현 수단이니까요. 모르죠, 10년 후에는 음악을 하고 있을 지도요. 전 지금도 요리사라고 불리는 게 어색해요. 요리로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.
이 공간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요?
남자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, 둘 다 공간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전기공사 빼고 다 직접 했어요. 다만 얼마나 오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어요. 중앙에 있는 테이블은 나무 작업하는 친구들이 도와줬고, 의자는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고요.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,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.
이렇게 근사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집 주방은 어떨지 궁금해요.
집이 걸어서5분 거리인데요. 아이러니하게도 집 주방은 텅 비어있어요. 모든 집기가 다 여기 있거든요. 작업실이 생기니까 주방을 둘로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. 뭔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건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일이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일이기도 하니까, 일과 생활을 분리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. 집에서 밥을 차려 먹건, 여기서 음식을 만들건 저에게는 똑같은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집과 작업실을 합치는 거예요. 집 주방을 지금의 팝업 식당처럼 운영하는 거죠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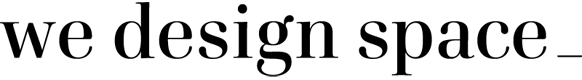







Leave a Reply